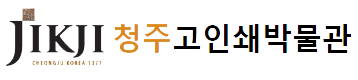어미 <-오>와 <-요>를 구별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. <이오>와 <이요>를 구별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문장을 끝맺을 때는 <이오>라고 쓰고, 연결할 때는 <이요>라고 쓴다고 말하는 것이다. ‘이것이 책이오.’라고 하여 문장을 맺으면 <이오>가 맞고, ‘이것은 책이요, 저것은 연필이다.’라고 할 때는 <요>가 맞는다고 설명하면 된다. 쉽지 않은가?
여기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. <오>를 끝맺을 때 사용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<요>라고 써서 틀릴까? 가장 많이 틀리는 예는 ‘어서 오십시요.’가 아닐까 한다. 앞에서 설명한 이오와 이요의 예를 보면 틀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.
그것은 발음이다. <이> 모음 다음에 <오>가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. <-오>라는 형태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발음으로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. <어서 오십시오>의 경우는 하십시오 체의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<오>라고 써야 한다. 하오체 문장의 경우도 당연히 <오>라고 써야 한다. <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.>나 <담배를 피우지 마시오.>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.
그런데 하오체 문장은 요즘 말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. 따라서 글 쓸 때의 명령에서 사용한다고 기억하면 될 듯하다. 앞에서 예로 들은 <이것은 책이오.>라는 말도 어색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. <이오>의 경우는 실제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. <이오>와 <이요>의 구별은 거의 필요 없고, 대부분 연결의 <이요>라고 기억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. 또한 <하시오/하십시오/마시오/마십시오> 같은 예를 기억해 두면 오라고 쓸 자리도 대부분 알게 된다. 즉, <오>라고 쓰는 경우는 위의 예들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된다는 말이다.
한편 오와 요를 혼동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해요체이다. 우리말의 비격식체에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다. 해체는 친근한 반말의 말투이고, 해요체는 친근한 높임말의 말투이다. 해체를 반말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말과는 차이가 있다. 보통 반말은 윗사람에게 하면 안 되지만 해체는 친근한 윗사람에게는 사용이 가능하다. 대표적으로 부모님이나 언니, 오빠, 형, 누나와 가까운 선배에게 사용할 수 있다. 그래서 해체를 반말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있다.
자 그럼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. 문장을 맺을 때는 오라고 쓰고 연결할 때는 요라고 쓴다고 했는데 당장 해요체라는 예외가 생기지 않았는가? 해요체 문장은 당연히 <요>로 끝나야 한다. 간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복잡해지지 않았는가? 문법과 맞춤법이 어렵다는 생각이 다시 들 것이다. 그런데 해요의 <요>는 하시오, 마시오의 <오>와는 차이가 있다.
<요>를 빼고도 말이 되면 <요>를 쓰고, 말이 안 되면 <오>를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. 예를 들어서 <밥을 먹어요>의 경우에는 요를 빼도 <밥을 먹어>로 말이 된다. 반면에 <들어가지 마시오>는 오를 빼면 <들어가지 마시>로 이상한 문장이 된다. 따라서 오를 써야 하는 것이다.
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 차례이다. 그렇다면 하세요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? 하세요도 해요체이다. 하지만 하세요의 경우도 <요>를 빼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세오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? 답은 하세요가 <하셔요>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. 하세요는 하셔요에서 변한 말이다. 하셔요의 경우는 <요>를 빼도 말이 된다. 따라서 해요체라는 의미이다. <하셔!>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된다. 여기에 <요>를 붙여 하셔요가 된 것이다. 문장 종결의 오와 요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게 되면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글이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읽어 볼 것을 권한다.